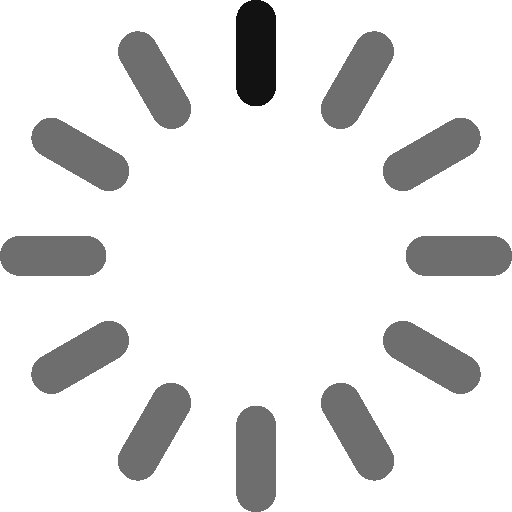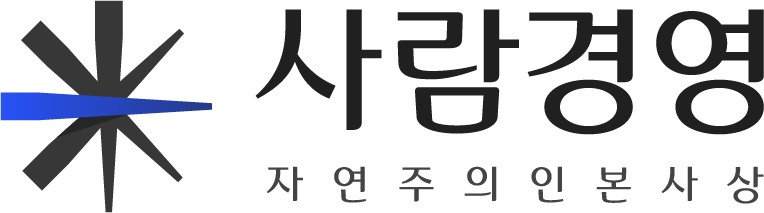역량은 성과를 만들어내는 힘입니다.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역량은 성과 행동의 원인이 되는 속성입니다.
“무엇을 보고 뽑을까?” 선거 때만 되면 나오는 말이지요. 유권자 입장에서는 선택의 기준입니다. 흔히 후보의 정책과 능력만 보고 뽑아야 한다지만 대개 공염불에 그칩니다. 겉으로 드러난 말과 행동만 보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지요. 요즘에는 이미지뿐만 아니라 팬덤도 힘이 세더군요. 역시 사람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기 마련인가 봅니다. 결국 요란하게 치장한 정치와 맹목적 지지는 서로에게 실망만 안기고 진흙탕 싸움으로 번집니다. 무턱대고 원하고 하염없이 원망하는 일이 반복되는 셈이지요.
이처럼 화려하고 보기 좋은 것들로 에워싸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진짜’가 무엇인지 잊기 쉽습니다. 채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지식, 기술, 태도(KSA: knowledge, skill, attitude)를 인재 선발의 기준으로 봅니다. 아예 뭉뚱그려 ‘역량’이라 부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거꾸로 역량이라는 말을 들으면 KSA를 떠올리기도 합니다. 사기업은 비교적 일찌감치 도입해 개량해왔고, 공공기관이나 공기업 역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이라는 이름으로 평가합니다.
짤막하나마 각각의 개념을 살펴볼까요.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일에 필요한 정보여서 공부하면 아는 것들입니다. 기술은 일하는 방법으로 반복하면 숙련되는 것들이고요. 태도는 일하면서 나타나는 행동, 즉 마음먹기에 달린 소양 정도라 하겠습니다.
이처럼 KSA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이라 개념도 쉽고 깊이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대부분의 기업이 따로 담당자를 두고 주입식이나마 교육까지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대개 훈련과 반복으로 각각의 수준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달리 말해, 남들 하듯 주어진 대로 따라 하면 언제 어디서든 습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누가 나은지 가리기 힘들 정도로 비슷해지기까지 하지요.
조직 구성원 모두의 ‘역량’이 이렇게 쉽게 좋아진다면 기업의 성과는 떼어놓은 당상이겠지요? 아쉽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KSA로는 성과를 장담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성과로 이어지는 ‘진짜’ 역량에 대해 잘 모릅니다. 역량은 쉬운 말 같으면서도 막상 설명하려면 쩔쩔맵니다. 워낙 다양한 의미로 쓰여서도 그렇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욱 어려운 것입니다. 역량의 개념을 제대로 모르니 누구나 익숙한 눈에 보이는 KSA를 역량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물론 KSA를 가볍게 보거나 아예 무시하자는 의미가 아닙니다. 엄연히 성과를 만드는 데 쓰이는 재료들이지만, 이들은 핵심 요소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이나 경향이 아닌, 사람의 본질에 가까운 ‘내적’ 역량으로 더 파고들어야 합니다.
![]()
역량이 진짜다
간단히 말해서, 역량은 ‘성과를 만들어내는 힘’입니다. 자동차로 치면 엔진입니다. 아무리 차체가 멀쩡해도 엔진이 엉망이면 자동차는 굴러가지 못합니다. 엔진이 자동차의 최종 성능을 좌우하는 것이지요. 역량은 자동차의 엔진처럼 겉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사람의 능력과 성과를 결정짓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사람으로 태어나 세상과 상호작용하는 가운데 자연스레 내면에 쌓이지요. 무의식을 기반으로 비인지 영역에서 형성되기 때문에 억지로 가르치고 배운다고 만들어지지도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역량의 개념과 구조를 설명할 때 스펜서-스펜서(L. Spencer & S. Spencer)가 제시한 ‘빙산(iceberg) 모델’을 듭니다. 이들은 역량을 특정 상황이나 직무에서 높은 성과를 만들어내는 내적 특성이라 말합니다. 빙산처럼 보이는 부분과 보이지 않는 부분으로 구분하는 것이 특징이지요. 여기서 지식과 기술은 수면 위에 드러나 있습니다. 반면에 수면 아래에 있는 특성, 동기, 가치관 등은 잘 드러나지 않는 무의식의 영역에 있어 보이지도 않고 측정도 어렵습니다. 빙산에서 수면 위로 드러난 부분이 인지 영역이라면, 수면 아랫부분은 비인지 영역에 해당되겠지요.
사람의 마음은 바다 위에 떠 있는 빙산과 같습니다. 수면 위에 드러난 빙산은 전체 빙산의 아주 작은 부분에 지나지 않지요. 즉 빙산 모델은 보이는 영역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역을 강조하기 위해 나온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현대 심리학자들은 사람의 마음을 5~10% 수준의 인지 영역과 반인지 영역, 그리고 90% 정도의 비인지 영역으로 봅니다. 말씨, 표정, 태도, 지식처럼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 레벨의 현상은 인지 영역에서 확인할 수 있지요. 성격, 지능, 기술 같은 심리 레벨의 경향은 반인지 영역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런데 이런 인지 영역의 요소들은 비인지 영역에서 만들어져 수면 위로 드러난 것일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의 본질과 가능성을 판단할 때 수면 위 현상이나 경향이 아니라, 수면 아래 ‘속성’을 들여다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것이 가장 크고, 무엇보다 ‘진짜’이기 때문이지요.
역량은 비인지 영역에서 발원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행동은 마음에서 나오고, 마음은 신경계에서 만들어집니다. 성과는 역량을 통해 만들어지고, 역량은 비인지 영역에 숨어 있는 생물학적·신경과학적 통합 특성에서 나오고요.
기업에서 말하는 인재는 그저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기업이 원하는 가치, 즉 ‘성과’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인재입니다. 아마도 성과와 관계없이 채용하는 기업은 단 한곳도 없을 것입니다. 열정은 있는데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결코 인재라고 볼 수 없지요.
역량과 인재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고 측정하여 성과를 예측하려면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행동과 심리 레벨에서의외현적 표현 능력보다는 생물학적·신경과학적 레벨에서의 내현적 통합 역량을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빙산 모델로 본 역량의 본질적 개념
기업 경영은 나무를 키우는 일과 같습니다. 기업의 성과는 나무의 열매에 해당하고, 그 열매는 이미 씨앗 속에 잠재되어 있습니다. 좋은 씨앗이 좋은 환경을 만나면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우며 꽃을 피우겠지요. 그 꽃이 지면 열매가 맺히고, 열매는 다시 씨앗이 되는 것이 자연의 ‘이치(理致)’이고요. 좋은 열매는 좋은 씨앗에서 비롯됩니다. 좋은 열매를 수확하려면 먼저 씨앗을 잘 골라야 합니다.
기업에서 씨앗은 사람이고, 씨앗이 품고 있는 가능성이 바로 ‘역량’입니다.
모든 콘텐츠는 제공자에게 저작권이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거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