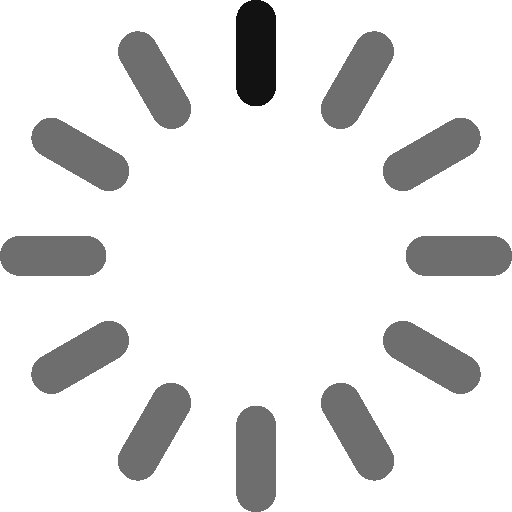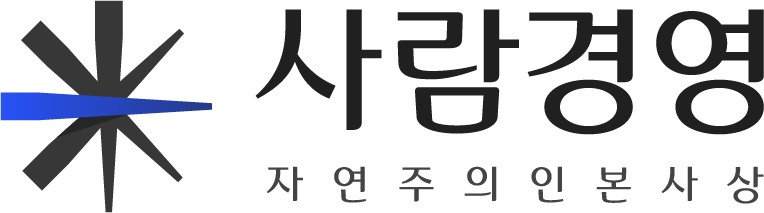능력=역량x지식x기술이며, 업무 능력은 관련 한 지식과 기술을 활용하여 성과를 만듭니다. 뛰어난 역량을 가진 사람은 동일한 지식과기술을 최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어떤 단어의 뜻을 모르면 먼저 사전을 찾아보지요. 그런데 ‘능력’과 ‘역량’은 국어사전으로도 분간하기 어렵습니다. 능력은 고작 ‘일을 감당해 낼 수 있는 힘’, 역량은 ‘어떤 일을 해낼 수 있는 힘’ 정도로 설명하네요. 어쨌든 두 가지 모두 일을 할 때 필요한 힘인건 맞는 것 같습니다.
한자를 풀어보면, 능력(能力)은 그저 ‘힘’을 말하고, 역량(力量)은 ‘힘의 크기’를 뜻하니 역량이 능력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또 나름 ‘측량하다’라는 뜻도 들어 있어 역량은 그 수준을 측정할 수 있음을 추정할 수 있고요.
영어에서도 ‘competence(능력)’와 ‘competency(역량)’를 구분하는데요, 역량은 보통의 능력과 달리 마치 ‘습관’처럼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라며 미묘한 차이를 드러냅니다. 일반인의 시각에서는 별 차이가 없어 보여 그런지 좀 더 쉬운 말인 능력으로 뭉뚱그리지요. 하지만 신경과학적 관점에서 보면 이 둘은 엄연히 다릅니다.
능력은 역량, 지식, 기술의 집합체입니다. 역량보다 넓은 개념이지요. 능력과 역량을 관계식으로 표현하면 ‘능력=역량×지식×기술’입니다. 여기서는 곱하기(×)에 방점이 찍힙니다. 세 가지 중 한 가지만 없어도 능력은 제로(0)가 되니까요. 요소별로 간단히 정의하면, 역량은 성과를 만드는 성능이고 지식은 재료이며 기술은 지식의 숙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식과 기술이 역량을 만났을 때 발휘되는 것이 ‘성과능력’이고요.
능력을 발휘하고 강화하려면 역량 못지않게 지식과 기술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식과 기술은 반복을 통해 얼마든지 습득할 수 있지요. 가령 나이가 들어서도 자전거나 수영을 배울 수 있고, 자격증 시험에도 도전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의 성능을 바꿀 수는 없어도 운전 기술은 능숙해질 수 있는 것처럼 말이지요. 게다가 요즘에는 대부분의 지식과 기술을 학교가 아닌 인터넷을 통해 그것도 무료로 습득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지식과 기술은 언제든 배우고 강화시킬 수 있지만, 역량은 뇌의 전전두피질의 발달과 함께 일정 시점에서 완성됩니다. 특히 성장기 전 과정에 걸쳐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만들어지지요. 그래서 똑같이 뇌 신경망에 흔적을 남기고 변화를 가져오지만, 그 양상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비가 와서 고이면 작은 물웅덩이가 되고, 비가 많이 오면 개울이 생기잖아요. 물웅덩이가 ‘지식’이라면, 개울은 ‘기술’과 같고, 개울이 모이면 개천이 되는데 그것은 ‘습관’과 같은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하천이라는 ‘성격’이 되고, 강이 되면 ‘역량’이 되는 것이지요.
![]()
역량은 인재의 필요충분조건
앞서 역량은 성과를 달성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뇌의 성능이라 했습니다. 지식은 역량이 성과를 만드는 데 필요한 재료이며, 기술은 연습과 경험을 통해 습득하는 일종의 절차 지식이고요.
뇌의 성과 메커니즘에서도 지식과 기술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지식은 전략 모색 단계에서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경로를 찾는 재료로 사용됩니다. 관련 지식이 부족하면 찾아낸 전략도 부실할 수밖에 없지요. 가령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해당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기본 지식이 필요합니다. 무릎 부상으로 특정 근육을 단련해야 한다면 일단 해당 근육을 단련하기 위한 효과적인 운동법을 알아야 하고요. 아인슈타인에게 수학이라는 지식이 없었다면 새로운 물리법칙인 상대성이론을 생각해 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M사는 지난 4년간 지식과 기술 수준의 성과평가 영향력(상관계수)을 추적해왔습니다. 그 결과 입사 7일차 단기 관찰에서는 역량에는 못 미치지만 지식과 기술도 어느 정도 영향력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6개월이 지나면서 급속도로 떨어졌고, 1년 후부터는 의미가 거의 없어졌습니다. 반면에 역량의 영향력은 계속 증가했습니다. 지식과 기술은 입사 초기 관계 형성 및 의사소통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시간이 갈수록 실제 업무 성과를 예측하지는 못한다는 것이지요.
사실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향상시키는 일조차 역량의 수준에 따라 큰 차이가 납니다. 전통적으로 지식과 기술을 중시하는 개발 직무 분야에서도 긍정성, 자기 주도적 적극성, 성장에 대한 강한 욕구, 그리고 노력 등 역량과 관련된 특성들이 개발자의 주요 성과 요인으로 꼽히고 있고요. (Rasch & Tosi, Factors Affecting Software Developers’ Performance : An Integrated Approach, MIS Quarterly, 2008 / Rodrigues & Rebelo, Incremental Validity Of Proactive Personality Over The Big Five For Predicting Job Performance Of Software Engineers In An Innovative Context, Journal of Work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2013)
![[Q4]-1 역량의 성과평가 영향력 추이, M사 사례](https://jainlab.im/hs-fs/hubfs/%5BQ4%5D-1%20%EC%97%AD%EB%9F%89%EC%9D%98%20%EC%84%B1%EA%B3%BC%ED%8F%89%EA%B0%80%20%EC%98%81%ED%96%A5%EB%A0%A5%20%EC%B6%94%EC%9D%B4%2c%20M%EC%82%AC%20%EC%82%AC%EB%A1%80.jpg?width=918&height=674&name=%5BQ4%5D-1%20%EC%97%AD%EB%9F%89%EC%9D%98%20%EC%84%B1%EA%B3%BC%ED%8F%89%EA%B0%80%20%EC%98%81%ED%96%A5%EB%A0%A5%20%EC%B6%94%EC%9D%B4%2c%20M%EC%82%AC%20%EC%82%AC%EB%A1%80.jpg)
역량의 성과평가 영향력 추이, M사 사례
![[Q4]-2 능력과 역량의 관계](https://jainlab.im/hs-fs/hubfs/%5BQ4%5D-2%20%EB%8A%A5%EB%A0%A5%EA%B3%BC%20%EC%97%AD%EB%9F%89%EC%9D%98%20%EA%B4%80%EA%B3%84.jpg?width=918&height=674&name=%5BQ4%5D-2%20%EB%8A%A5%EB%A0%A5%EA%B3%BC%20%EC%97%AD%EB%9F%89%EC%9D%98%20%EA%B4%80%EA%B3%84.jpg)
능력과 역량의 관계
역량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 어떤 지식과 기술도 사실상 무의미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지식과 기술을 갖췄다해도 세상이 부여한 기회를 부정하거나 불신하고, 소극적이며 불성실하다면 어떤 일을 해도 성과를 낼 수 없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성과는 능력이라는 원인의 결과이고, 능력은 보다 본질적이고 속성적 원인인 역량의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즉 능력은 사실상 역량을 통해 발휘되 고성과로 증명되는 것이지요.
능력과 함께 ‘적성’이라는 말도 많이 씁니다. 예체능계만 보면 ‘타고난 적성’이란 말은 분명 맞습니다. 하지만 역량 차원에서 적성이란 말은 없습니다. 일정 수준의 역량을 가졌다면 어떤 일을 해도 일정 수준의 성과를 내니까요. 그토록 애지중지하는 스펙은 그다지 관계가 없고요.
역량은 뇌의 성능이라서 자신의 노력만으로 원하는 만큼 가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지식이나 기술은 의도적 학습과 꾸준한 노력을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만큼 얼마든지 획득할 수 있지요. 그렇다 보니 현실에서는 능력을 어떻게 키울지에 대한 관심과 고민이 주로 지식과 기술로 쏠립니다. 특히 채용에서 선발 기준으로 삼으니 이 허들을 넘으려면 어쩔 수 없습니다.
역량이야말로 실전에서 능력을 발휘하기 위한 핵심 요소입니다. 스펙은 단지 지식과 기술을 보여줄 뿐입니다. 스펙보다는 역량에 초점을 두고 인재를 선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채용 시장에도 선발의 '새로운 표준(new normal)'이 확립되어야 하고, 그것은 바로 '역량'입니다.
모든 콘텐츠는 제공자에게 저작권이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거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