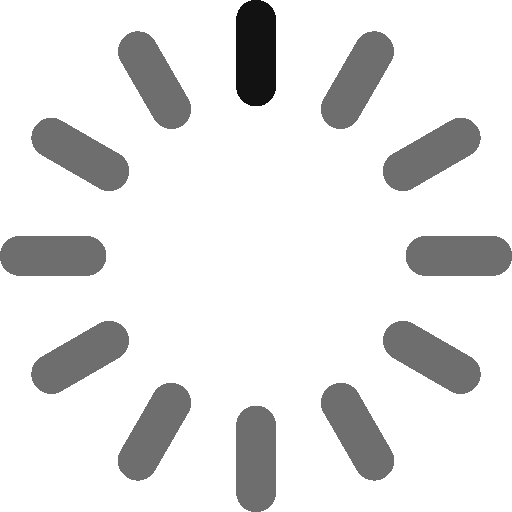교육 칼럼
삼인칭의 나 | 주관적에서 객관적으로
교육 칼럼
삼인칭의 나 | 주관적에서 객관적으로
둘이 있다 보면 자리에 없는 사람 얘기도 하게 됩니다. 특히 험담하기 좋지요. 그 사람은 지금 여기에 없으니 둘이 맞장구치기 딱 좋은 겁니다. 애나 어른이나 똑같습니다. 주로 ‘나’의 입장에서 보거나 듣거나 해석한 것투성이지요. 그래서 왜곡되기가 십상이고요. 그 사람은 항변할 기회조차 없습니다. 그 대신 어디선가 나나 너의 험담을 할지 모르지요. 알게 모르게 주고받는 겁니다. 험담은 이렇게 돌고 돌아 결국 내게로 돌아옵니다. 험담의 속성이지요.
‘험담’을 험담하려는 게 아닙니다. ‘시점’을 말하려는 거지요. 말이든 글이든 표현하는 사람의 위치나 관점이란 게 있습니다. 우리의 시점은 보통 ‘일인칭’입니다. 별수 없지요. 둘만의 이야기를 할 때도 실상 같습니다. ‘너는 지금 기분이 나빠’ 같은 표현은 좀처럼 하지 않지요. ‘너는 지금 기분이 나빠 보여’ 하는 거지요. 편지를 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신자인 너의 이름을 아무리 불러도 역시 내 시점에서 네 이야기를 쓰는 겁니다. ‘나’라는 주체이자 한계에 갇히지요.
〈사랑손님과 어머니〉는 아이들이 ‘꼭’ 읽어야 할 단편으로 꼽힙니다. 바로 ‘옥희’ 때문이지요. 아니, 옥희의 ‘시점’ 때문입니다. 옥희는 여섯 살 난 여자아이입니다. 그 눈으로 어른들 사이의 일과 감정을 관찰해 이야기하지요. 그 덕분에 재미가 더해지고 귀엽기까지 합니다. 작가가 의도한 거지요. 옥희의 순수한 시점이 없었다면 이 작품은 그저 식상한 사랑 이야기로 그쳤을 겁니다. 이처럼 이야기의 시점에 가장 신경을 쓰는 이들이 ‘소설가’입니다.

소설은 화자가 누구이고 또 어떤 위치에 있는가에 따라 읽는 맛이 달라집니다. ‘일인칭시점’의 화자는 ‘나’입니다. 작품 속에서 주인공 혹은 관찰자가 되지요. <사랑손님과 어머니>에서 ‘나’는 옥희입니다. 옥희가 겪은 일을 옥희가 직접 말하기 때문에 생생하게 읽힙니다. 반면에 그만큼 ‘나’라는 틀에 갇힙니다. 옥희는 어른들의 감정을 제멋대로 해석하고 오해하지요. 물론 그 점이 재미를 유발합니다. 하지만 읽는 이에 따라서는 아쉬움을 느낄 법도 합니다. 너무 ‘유치’하다는 거지요.
보통 삼인칭시점에 능수능란할수록 이야기꾼의 소질이 있다고 합니다. ‘삼인칭’은 화자와 청자 이외의 존재를 가리키지요. 대개의 소설가가 실제 세상을 바라보는 위치이기도 합니다. 한두 발 떨어져 있는 겁니다. 보다 객관적으로 ‘실체’와 ‘실존’을 보기에 좋으니까요. 사실 우리 눈앞에 보여지는 모든 게 삼인칭입니다. 나와의 거리가 가깝다고 이인칭처럼 보여도 끝내는 삼인칭입니다. 가족마저 ‘너’나 ‘우리’가 아닌 ‘제삼자’로 낯설게 보일 때가 있지요. 노랫말도 있습니다. ‘남’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를 지워 ‘님’이 돼도, 점 하나만 찍으면 도로 ‘남’이 됩니다. 세상은 요지경이지요.
문제는 소설이 아닌 현실에서도 ‘전지적(全知的)’ 태도를 보인다는 겁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다 아는 척하지요. 이인칭, 삼인칭 할 것 없이 대상의 맨 밑바닥 사정까지 모조리 안다고 떠들어댑니다. 물론 소설에선 가능합니다. 소설가는 자기 작품에 관해선 창조자 신과 다를 바 없으니까요. 어차피 인물과 배경, 사건 모두 허구이니까요. 그래서 보통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 하지요. 험담이란 게 이런 창작과 참 비슷합니다. 아이들이 푹 빠져 있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는 어느새 험담과 비방의 성지가 되었고요. 연예인, 정치인, 운동선수는 물론 일반인에 이르기까지 인터넷 군중의 ‘조리돌림’은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명작 소설 버금가는 창작이 성행하지요. 그것도 전지적시점을 빙자한 일인칭시점으로 말입니다.
그 와중에 일인칭 ‘주인공’ 시점 작품(?)도 눈에 띕니다. 이른바 ‘패션우울증’이지요. SNS에 괜히 ‘우울하다’는 글만 올려도 여기저기서 몰려와 위로와 관심의 댓글을 달아주니까요. 우울마저 서로 인정받고 싶고, 서로 인정받아야 하는 거지요. 물론 미성숙한 아이들이기에 그럴 수 있습니다. 실제 우울할 수 있고요. 하지만 그 정도가 지나치면 우울마저 습관이 되는 겁니다. 더 나아가 일인칭 ‘과시’의 세계에 빠져들 수 있고요. 무조건 나의 감정과 기분을 받아들이라는 태도 말입니다. ‘짐이 국가다’ 외친 절대왕정의 군주처럼 ‘짐은 우울하다’ 명령하는 것과 같지요. 그러면서 긍정적 감정을 누릴 수 있는 상호작용의 기회조차 잃고요.

‘MBTI’에 대한 맹신과 맹종도 일인칭 세계를 강화합니다. 잘 알다시피 이런 테스트는 과학적 근거와 통계적 검증이 부족합니다. 그저 ‘놀이’일 뿐이지요. 애나 어른 할 것 없이 관심을 보여 이젠 ‘사회적 놀이’가 되었을 뿐입니다. 그렇다 해도 ‘놀이’와 ‘재미’라는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잘 팔리는 대중문화 상품이지요. 요즘 아이들은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자기 주도성을 강요받으며 자란 세대입니다. 스스로 학습하고 적성을 찾고 책임감을 가지라는 말을 수없이 듣습니다. 교육이 앞장서서 ‘각자도생’을 부추긴 꼴이지요. 그러니 문제에 부딪치거나 실패했을 때 아이들은 핑곗거리를 찾게 됩니다. 그래서 고작 믿는 게 ‘MBTI’인 거고요. 알량한 네 개의 알파벳 조합으로 ‘나는 이런 사람’이라 소개하며 스스로를 한정시킵니다. 정체성의 발견은커녕 오히려 자기 성장과 발전의 크기를 줄입니다. 한창 상호작용해야 할 시기에 서로가 서로의 잠재력을 죽이는 겁니다.
교육이란 아이들로 하여금 ‘나’라는 막무가내 일인칭과 작별하도록 돕는 일입니다. 그것을 ‘성장’이라 하지요. ‘나’는 주로 대등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나 아랫사람을 상대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이를테면 이런 ‘나’가 아닌 ‘저’라는 표현을 몸에 익히도록 돕는 일이 교육인 겁니다. 최소한 이인칭 상대방은 의식하도록 만드는 거지요. 익숙하지만 편협한 일인칭시점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마저 ‘객관화’하는 시점으로 서서히 위치를 옮겨야 하고요.
결국 시점이 태도를 결정합니다. 성숙한 사람은 제삼자의 시점에서 스스로를 바라볼 줄 압니다. ‘삼인칭의 나’가 결코 낯설지 않습니다. 망원경과 현미경을 동시에 갖춰 객관성과 균형을 유지하는 거지요. 청소년기는 아동기에서 성인기에 이르는 ‘과도기’입니다.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매우 불안정합니다. 특히 시점이 흔들리지요. 따라서 자아 정체성에 혼란을 겪습니다. 어린아이와 성인이라는 두 개의 자아가 충돌합니다. 또 이상적 자아와 현실적 자아의 괴리를 처음으로 경험합니다. 갈등과 좌절의 나날일 수밖에 없지요. 이런 혼란 속에서 아이들은 자신이 누구인지 묻게 됩니다. ‘사춘기’의 뚜렷한 징후지요.
아이들에게 ‘삼인칭의 나’를 발견할 기회와 경험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를테면 삼인칭시점의 ‘일기’를 써보게 하는 것도 좋습니다. 심리학자 제이슨 모저는 화가 날 때 긍정을 주입하거나 강제하면 역효과가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뇌가 더 혼란스러워지기 때문이지요. 그때 삼인칭시점으로 속마음을 이야기하면 감정이 어느 정도 사그라들 수 있습니다. 차라리 ‘삼인칭 혼잣말’이 낫다는 거지요. 일기라는 특성에 얽매이지 말고 마치 객관적 사실을 서술하듯 ‘나’와 멀찍이 거리를 두고 쓰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더 솔직해질 겁니다. 또 자신에게 더 ‘쿨’해질 겁니다. 일인칭에서 벗어나면 자신이 특별한 동시에 대단히 평범하단 걸 깨닫게 됩니다. 험담하고 비방하는 자신을 스스로 야단칠지 모릅니다. 왜 화가 나고 싫은지 차분히 정리하다 보면 어느새 나쁜 감정이 풀릴 수 있습니다. 운이 좋으면 천재 소설가로서의 면모와 자질을 발견할지도 모릅니다.
모든 콘텐츠는 제공자에게 저작권이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거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
인생
성장 | 진정한 행복의 길은 오늘보다 나은 내일에 있습니다
-
인생
성과 | 열심히 하는데 왜 성과가 나지 않을까요?
-
인생
역량 | 부족한 저도 성공할 수 있을까요?
-
인생
습관 |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점
-
인생
메타인지 | 느끼고, 깨우고, 바꾸다
-
인생
CSR | 소통, 전략, 성찰의 힘
-
인생
태도 | 인생을 바꾸는 세 가지 태도
-
인생
인생방정식 | 세상과의 상호작용, 풍성한 인생을 만드는 열쇠
-
성과
OKR | 구글은 되는데, 우리 회사는 안 되는 이유?
-
인생
부캐 | 사랑보다 내가 더 소중한 사람
-
전략
퇴고와 성장 | 메타인지를 깨우세요
-
인생
자아 | 중력을 거스르는 아름다운 안간힘
-
육성
연극의 이유 | 진짜 인생을 사는 길
-
역량
상호작용 | 나는 유전적으로 태어나 환경과 상호작용하며 만들어진다
-
육성
중2의 방문 | 중2병의 진실은 뇌에 있다
-
전략
인지의 거울 | 메타인지를 키우는 교육
-
교육
삼인칭의 나 | 주관적에서 객관적으로
-
인생
기억 | 못 잊어 생각이 나겠지요
-
인생
무의식 | 허공을 뛰는 사람들
-
성과
보상 | 봉급과 승진이 정말 최선의 보상일까?
-
경영
채용 | 복사는 내 업무가 아닌데 왜 시키는 거죠?
-
경영
문화 | 포용하는 문화를 만드는 열쇠
-
성과
채용 | 귀하의 뛰어난 '역량'에도 불구하고..?!
-
성과
성과 | 성과와 행복의 중심에 있는 전전두피질
-
연구
기억 | 당신이 연인과의 첫 만남을 기억하지 못하는 이유
-
경영
문화 | 신뢰의 기반은 평등이 아니라 공정이다
-
경영
의사결정 | 집단지성은 언제나 옳을까?
-
성과
리더십 | 훌륭한 리더는 구성원들이 만든다
-
경영
동기 | 열심히 일하는 사람 vs 재미있게 일하는 사람
-
경영
보상 | 성과급이 성과에 도움이 될까?
-
인생
미래 | 나는 내 인생의 예언자
-
인생
감정 | 감정 탓일까, 엘베 새치기
-
경영
소통 | 따뜻한 말이 똑똑한 말보다 강한 이유
-
인생
행복 | 미로 같은 쇼핑몰을 벗어나려면
-
인생
성공 | '운(運)'은 대체 어디로 가는 걸까
-
인생
욕망 | 인생을 빚는 보이지 않는 손
-
교육
토끼의 노래 | 뇌의 가소성과 잠재된 희망
-
역량
나는 뽀로로 | 아이는 경험한 만큼 자란다
-
인생
성장 | 둥글게 원을 그리고 살다 보면
-
육성
리더십 | 성공하려면 성공을 지원하라
-
인생
관계 | 시장이 활기로 가득 찬 이유
-
교육
대칭의 미래 | 본성과 양육의 기묘한 관계
-
연구
의식 | 나를 만드는 생각의 본질
-
인생
편향 | 오리가 뒷짐을 지고 걷는 이유
-
인생
소통 | 겨울 숲 도토리 떨어지는 소리
평점은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입력하시겠습니까?
글이 도움되셨나요?
사람경영레터 구독 후,
매주 다양한 콘텐츠를 경험해보세요.